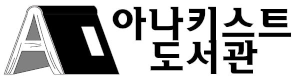이안 맥케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AK Press에서 제가 제안한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선집(A Pierre-Joseph Proudhon Reader)』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프루동의 2010년 선집을 읽고 싶으시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루동의 글을 추천하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혹시 프랑스어 원문을 번역하는 데 흥미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프루동이 1848년 혁명을 두고 쓴 글은 꼭 영어로 번역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위에 첨부한 프루동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Radical Routes의 21주년 기념 회의에서 아나키즘 경제학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Radical Routes는 주택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회복지관 사이 연합체입니다. 회의 주제는 “실질적 경제학: 실패한 경제 체제의 급진 대안”이며, 5월 23일 런던의 콘웨이 홀(Conway Hall) 레드라이언 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제 블로그의 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협동조합 형성이, 특히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를 점거하고 사장을 내쫓고 일터를 변화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An Anarchist FAQ』 (AFAQ)의 제1장을 교열하고 있는 중이라, 아나키즘 사회의 경제학 개요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아나키즘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좋은 발표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상하는 자유로운 사회는 우리가 현재 체제에서 혐오하는 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나키스트의 자본주의 비판도 간략히 설명해합니다.
논의는 자연히 프루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명백한” 아나키즘적 경제 형태, 즉 시장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농공업 연방(agro-industrial federation)과 공동체 연합과 상호은행으로 구성된 상호주의(mutualist)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집산주의적 아나키즘을 거쳐, 농공업 연방과 코뮌 연합이 보완하고 생산 단위 간 수평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된 경제 체제로서 코뮌주의적 아나키즘을 다루겠습니다. 폰 하이에크von Hayek와 폰 미제스von Mises 등 인물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실패하리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찬사를 받는 모습은 기묘합니다.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이 계획경제는 지역 지식을 무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 폰 하이에크와 미제스보다 수십년 전에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론에서 다소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상호주의가 사회주의일까요? 물론입니다! AFAQ의 G.1.1절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크스, 엥겔스, 바쿠닌, 크로포트킨은 모두 프루동을 사회주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G.1.2절에서 언급했듯이, 재산(property)과 점유(possession), 혹은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말하면 재산과 자본(capital)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련된 인용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본] 존재의 역사적 조건은 단순히 화폐와 상품의 유통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생산과 생활의 수단을 소유한 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할 때에만 발생한다." (Marx, 『Capital, vol. 1, p. 264)
"정치경제학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매우 다른 종류의 사유재산을 혼동하는데, 하나는 생산자 자신의 노동에 기반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데 기반한다. 정치경제학은 후자가 전자의 직접적인 대립일 뿐만 아니라 전자의 무덤을 딛고서만 성장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생산자가 가로놓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생산자는 자신의 노동 조건의 소유자로서, 자본가가 아닌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동한다. 두 상반되는 경제 체제의 모순은 자본가와 생산자 사이의 투쟁 속에서 실체 있게 드러난다.” (ibid., p. 931)
"생산과 생활의 수단은 생산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자본이 아니다. 두 수단이 동시에 노동자 착취와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만 자본이 된다."(ibid., p. 938)
"노동자가 각자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서로의 상품을 교환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상품은 자본의 산물이 아니다." (ibid. vol. 3, p. 276)
“생산의 목적, 즉 상품을 생산하는 일 자체가 생산 도구를 자본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상품생산은 자본 존재의 전제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생산자가 단지 자신이 자신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한 그는 자본가가 아니다. 생산자가 자기 도구를 사용해 타인의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본가가 된다.” (Engels, Marx-Engels 『Collected Works』, pp. 179-80)
프루동의 분석과의 유사성은 분명합니다. 사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프루동의 재산(property)과 점유(possession)의 구분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물론 구분을 다소 좁혀 생산수단에만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프루동의 눈에는 재산이지만 마르크스의 눈에는 자본이 아닌 임대주택 등은 제외했습니다. 아마 놀랍지 않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기 생각과 프루동의 생각 사이 유사성을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프루동을 경쟁자로 여겼고, 난처하게도 프루동이 착취는 작업장에서 비롯하며 자본주의는 조합에 기반한 사회주의 사회로 대체되리라는 등의 공통된 주장을 먼저 펼쳤기 때문입니다.
프루동은 상호성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산업 분야의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해 임금을 주고 생산물을 차지하는 기업가를 위해 일하는 대신, 서로를 위해 일하며 공동 생산물의 이익을 함께 나누며 협력할 때 상호성은 드러난다. 이러한 상호성의 원리를 확장해 각 집단의 노동을 하나의 단위로서의 노동자 협동조합에 귀속한다면, 정치 경제 미학 등 모든 관점에서 이전의 문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창조하게 된다.”[Martin Buber, 『Paths in Utopia』, pp. 29-30]
상호주의(mutualism)는 자주관리(self-management)와 자유로운 생산수단으로의 접근(사회화)을 통해 임금노동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장과 가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호주의는 코뮌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항상 코뮌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뮌주의 내에서도 입장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유지상주의적 코뮌주의(libertarian communism)는 사회민주주의와 근본에서 다릅니다. 차이는 코뮌주의를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접근, 즉 개인의 자유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시장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생산수단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앙 계획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르크스주의에는 양측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코뮌의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미래상에 프루동이 끼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누락입니다. 프루동의 영향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프루동의 실제 사상은 원초 상당 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집 출간이 시급한 것입니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루동 사상과의 명백한 연관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종종 프루동의 사상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AFAQ의 H.3.14절을 인용하자면,
더욱이, 파리 노동자의 목표는 『공산당 선언』과는 어긋났고 아나키즘과 일치했다. 가장 분명하게도, 임금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노동자 협동조합 요구와 『연방의 원리』에서 제기된 농공업 연방 모두 프루동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파리 코뮌의 협동조합적 생산 구상은 프루동이 명확히 “산업 민주주의”라 부른, “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할 아래 산업을 재조직하는 것”의 명백한 실천이었다. [K. Steven Vincent의 인용문, 『Pierre-Joseph Proudhon and the Rise of French Republican Socialism』, p. 225]
파리 코뮌 당시 노동자 계급이 위 자유지상주의적 이상을 실천했을 때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시도를 지지했으며, 코뮌을 계기로 자신의 사상을 신속히 수정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엥겔스의 역사 수정주의로 다소 가려졌습니다. 1891년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 The Civil War in France』 서문에서 엥겔스는 프루동이 대규모 산업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에 반대했다고 묘사하며, “모든 협동조합의 큰 단일 연합으로 결합”은 “프루동 학설과 정반대”이므로 “파리 코뮌은 프루동 학설의 무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elected Works』, p. 256]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 결성과 조합 간 연맹은 프루동 사상의 핵심이었고, 따라서 파리 코뮌 참여자는 분명 프루동의 이상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자칭 반대자와 특히 레닌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옹호자와 함께 자본주의가 시장과 동일하다거나 자본주의는 시장과 반대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은 모순적입니다. 별로 마르크스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데이비드 슈바이카르트(David Schweickart)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시장에 맞춰진 초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동일시는 자유방임[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와 대부분의 반좌파 모두가 범하는 해로운 오류이다⋯. 자본주의의 주요 옹호자의 저작을 살펴보면,⋯ 그들의 논리는 항상 시장의 미덕과 중앙집권적 계획의 결함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을 변론하기가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다른 두 체제를 변론하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는 임금 노동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시선을 돌려 시장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Market Socialism: A Defense", pp. 7-22,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ts』, Bertell Ollman (ed.), p. 11]
슈바이카르트(Schweickart)가 자신의 제시한 유사 체제를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라고 불렀듯이, 이러한 시장 협동조합 체제를 "시장 아나키즘(market anarchism)"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아나코’ 자본주의자가 자신의 사상을 새롭게 포장하고자 이미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산주의자(propertarians)는 “시장 아나키즘”이 “1849년 벨기에 경제학자 귀스타브 드 몰리나리(Gustave de Molinari)에 의해 시작”됐으며, 시장 아나키즘이 “‘아나코’자본주의”보다 "논쟁이 덜한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Roderick T. Long, Tibor R. Machan, "Preface", Anarchism/minarchism, p. vii] 롱(Long)은 몰리나리가 “시장 아나키즘의 창시자”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Market Anarchism as Constitutionalism", pp. 133-151, Op. Cit., p. 141] 그러나 결정적으로, 몰리나리는 결코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나키즘적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즉, 몰리나리를 어느 아나키즘적 학파의 ‘창시자’라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롱이 했듯 몰리나리와 터커(Tucker)를 동일시한다면 두 사람이 각자 주장한 재산권(property) 사이 상당한 차이점을 무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터커는 상당 부분 프루동과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프루동이 그랬듯이, ‘시장 아나키즘’을 대신 상호주의(mutualism)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라고 부르면 재산주의 우파가 용어를 빼앗아 가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저는 자주관리 협동조합 시장에 기반한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개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은 자본주의와 동일하지 않듯이, 시장 기반 사화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시장 자체가 자본주의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이며, 기본적으로 말라테스타(Malatesta)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말라테스타의 열렬한 팬입니다. 말라테스타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시장은 비(非)자본주의적 형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장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코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프루동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 인정해야 공평합니다. 프루동이 말하길, “연방의 원리가 기본 논리에서 아무리 흠잡을 데 없다 하더라도⋯. 연맹을 계속해서 와해시키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의 맥락에서 연합은 상업과 산업에서 상호 안전을 제공하도록 고안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방은 시민을 자본가와 금융 착취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방의 집합체는 ‘농공업 연방’이다.” [The Principle of Federation, p. 67, 70]
마지막으로,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가 1950년대에 쓰고 출판하지 않은 글을 찾았는데, 글에서 로스바드는 자신의 사상, ‘아나코’ 자본주의가 아나키즘의 종류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스바드의 결론은 거의 모든 아나키스트가 ‘아나코’ 자본주의를 접할 때 내리는 결론과 동일합니다. 로스바드 글을 AFAQ 블로그에 다뤄 게시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2010년에 출간할 예정인 AFAQ 제2권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여기에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1권에서는 왜 ‘아나코’ 자본주의가 아나키즘의 한 형태가 아닌지를 설명했는데, 아나키즘은 근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이자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나코’ 자본주의의 창시자 머리 로스바드가 1950년대에 쓰고 안타깝게도 출판하지 않은 글이 최근 발견되었는데, 로스바드의 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나키스트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를 고려하면 다소 부정확한 제목인 「자유지상주의자는 ‘아나키스트’인가?Are Libertarians ‘Anarchists’?」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나키즘을 왜곡하는 오류와 날조를 제치더라도, 로스바드의 글은 다음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며, 우리를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확고한 어원적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비역사적이다.” 로스바드의 결론은 크로포트킨이나 바쿠닌 같은 “주류 아나키스트”뿐만 아니라 로스바드가 “아나키스트 중 최고”라고 여긴 개인주의 아나키스트 터커에게도 해당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로포트킨, 바쿠닌, 터커 모두 자기 사상 속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스바드가 보기에, “자유주의의 황금기(Golden Age of liberalism)” 속에 자신의 사상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상가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를 포함한 “모든 아나키스트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교리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로스바드의 글을 위키피디아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항목에서 인용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재산주의자(propertarians)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성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위키피디아 항목에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이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가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까지,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