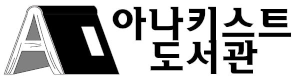자치 퀴어공간 구성의 아마추어리즘과 아나키즘
지난 20년에 걸쳐, 여러 지리학자와 인류학자와 건축 이론가는 게이와 퀴어 공간을 주제 삼아 집필했다. 번개 만남cruising과 공공 성행위 장소에 대한 글(Bell 2001; Binnie 2001; Turner 2003)과 가정공간을 통해 이뤄진 레즈비언 사회망에 대한 소수의 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업은 게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주류 산업 게이 무대 쟁점을 다룬다(Knopp 1992; Nast 2002; Quilley 1997). 반면에, 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밖에 존재하는 (또는 최소한 그러려고 하는)[1] 퀴어 현장에 참여하고, 연구하고, 집필하며 지난 몇 년을 보냈다. 이 책의 존재 원인이 된 “아나키즘과 섹슈얼리티” 학회는 내가 퀴어 학회를 비롯한 여러 학술 모임에서 만난 이와 다른 청중에게 이런 현장의 학술 분석을 제공할 기회를 줬다. 새 청중 사이에는 내가 다룬 여러 현장에 친숙하고 심지어 이 현장에 참여하고 조직한 경험이 있는 이도 많았다. 학회 발표를 할 때 나는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려는 주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회는 예외였다. 퀴어 자치를 위한 과업을 지나치게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죄목으로 비난받을 걱정과, 청중 사이 더 ‘운동권적인’ 이들이 운동권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자치를 향한 발버둥을 발굴하려는 내 노력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청중은 내 발표에 경청했고, 발표 이후 퀴어 자치공간을 다룬 두 논문의 논의는 지난 십년 간 어느 학회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활기찼다. 내 논문을 확장해 만든 본 장에는 당시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포함하려고 했다.
따라서 본 장은, 퀴어 자치공간의 형성과 복구를 위한 실험을 담았다. 나는 국제 ‘퀴어럽션Queeruption’ 모임과 자금조달 행사와 게이 소비 현장에서 퀴어 개입 등, 아나키즘적 이상에 영감을 받은 활동가가 조직한 공간을 탐구할 것이다. 이런 공간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아나키즘적 사상이나 자치정치 운동과 직접적인 영향이나 관계없이 다른 형태의 퀴어 자치가 생겨나는 행사와 순간을 생각하기도 하며 논의를 조금 복잡하게 하고 싶다. 내가 고려하는 색다른 퀴어 공간은 주류 산업 무대의 경계에 존재하는 ‘직접하기do-it-yourself’ 동호회 행사부터, 영적spiritual 모임과 비산업적 공공 성관계 공간으로 작용하는 (흔히 남성 중심적) 퀴어 공용지의 말소로부터 대항하기 위한 자기조직화된 방어를 다룬다(Brown 2009). 이런 공간들은 내제된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다른 맥락에서 보다 퀴어스러운 삶은 무엇인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내게는 중요하다.
퀴어 자치 현장
더 나아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에서 ‘퀴어’는 규범적 이성애에 의해 ‘타자화’되는 모든 이를 위한 단순한 포괄적 용어를 넘어섬을 확실히 하고 싶다. LGBT같은 여러 정체성 범주로 이뤄진 다양한 두문자어의 동의어를 초월한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공간에서 ‘퀴어’는 이성애규범성에 반대하는 만큼 동성애규범성에도 반대한다. 퀴어는 동성애자 대중이 가정성과 개인주의 소비에 기반한 탈정치적 문화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주류 게이 정치인에 대항한다. 퀴어는 젠더와 성적 유연성을 기념하고 의도적으로 이분법을 모호하게 한다. 단순한 정체성 구분이기보다, 성과 젠더 구분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제이미 헤커트Jamie Heckert(2004)가 제안했듯, 진정으로 급진적인 섹슈얼리티 정치는 단순한 관습 위반을 초월해, 정치의 방법론에 예를 들어 협력적, 비권위적, 성긍정적 관계 같은 윤리 목표를 부합해야 한다.
본 장에서 내가 다루는 퀴어 자치공간은 이런 윤리 목표를 실천할 공간을 만드려는 노력이다. 실제로, 자치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으며, 참여자들은 여러 윤리 목표 실천에 동참했다.
사회모임과 집합장소와 국제공동체 등 여러 사회자치를 실험하는 현장의 최신 연구로 제니 피커릴Jenny Pickerill과 파울 체터튼Paul Chatterton은 이런 공간은 “대중이 대항과 창조를 통해 비자본주의적, 평등주의적 그리고 연대중심적 정치‧사회‧경제 조직을 구성하려는 갈망이다,”고 설명했다(Pickerill and Chatterton 2006:730).
위 자치 현장의 집합체는 임금노동과 자본주의적 소비와 대의민주정에 대해 유효한 소규모 대안을 제공한다.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1991)처럼, 피커릴과 체터튼은 참여자 간 상반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자치 사이의 갈등은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협의하는 공동의 과정이 자치라고 강조한다(Pickerill and Chatterton 2006:733). 따라서 자치는 항상 불온전하며, 자치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치성과 위계 구조에의 소외된 의존성 사이 갈등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대항해야 한다. “상징적이나 물질적으로나, 자치공간은 일상적인 투쟁이 생성되고 재생성되는 미완성된 지대이고, 대중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 실재하는 세상과 희망하는 세상 사이에 사는 사실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순을 직면하는 곳이다” (ibid.: 736–7).
자치성을 선언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관적 과정이다. 지극히 맥락에 의존하고, 실험을 실현하는 시간과 장소 말고도, 관여하는 모든 이에 의해 조각된다(Brown and Pickerill 2009). 자치는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협업해 함께 일궈가는 과정일 뿐이다. 나아가, 타인은 자치를 실천하는 물리적 장소에 함께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치실험의 실천에 함께하는 이 간 복합적인 위치‧시간 관계망이 존재한다. 지난 실험은 기념하고, 그로 얻은 교훈 위에 새로이 쌓아 올림과 동시에, 초지역적 연대망은 실천적 방법론을 지구 한쪽에서 건너편으로 전하기를 돕는다(Olesen 2005). 아래 설명하겠지만 (217쪽을 참고), 실험의 교훈은 새로운 장소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 도입해 모방할 때 일어나는 번역상 오류로 소실되곤 한다. 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급진 퀴어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자치 경향 탐구의 핵심은 자치가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치공간과 비자치 공간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ickerill and Chatterton 2006:737). 자치를 향한 끌림은 급진적 활동가에게 한정되지 않고, 자신 원하는 바를 타인이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직접 좌지우지하려는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있다. 자치를 향한 여정 자체가 목표가 된다. 권위를 쥔 이를 경배하지 않고 매 순간 손에 든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은 최종 목표를 이루는지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 서술할 퀴어 자치공간과 실험은 성적 반체제자와 젠더 무법자가 자신의 뜻대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아가 세계 북반구 대도시에서 개이 생활양식은 상품화로 포화됐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더 이상 사회 구성의 능동적인 참여인이 아닌 생산과정과는 분리된 물건의 소유인으로 서로를 보게 된다. “행함doing”의 사회적 생산관계는 “됨being”의 관계로 (이 경우, 게이 됨) 변질된다. 대중이 자신의 산물로부터 분리됨,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Holloway 2002). 여기 서술할 퀴어 자치공간은 자본주의 사회관계로부터 휴식을 제공하고, 섹슈얼리티가 생산 과정과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상품의 습득 행위로 전락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려 한다. 퀴어 자치공간에서 섹슈얼리티는 다른 방식으로 예우하고, 이의제기하고 실천한다. 무엇보다, 자치 공간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이는 권위와 권력을 취하며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대안 공간을 구성했다. 퀴어 자치 실험은, “지배받는 삶”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과정의 일부로서 “행하기 위한” 권리를 다시 한번 행사하는 작고 소박한 노력이다[2].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자치 퀴어공간 내 ‘퀴어’는 단순한 정체성 구분이 아닌 대중 간 관계의 과정으로 작용한다는 내 초기 주장으로 회귀한다. 퀴어는 우리 삶의 조건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부) 젠더 무법자와 성적 반체제자의 공동으로 실천하는 윤리 관계이다. 지금 당장 여기에, 자본주의 넘어 삶과 오늘날 우리에게 떠먹여지는 소비가능한 정체성의 제한된 폭을 형식과 과정으로 예시한다. 이 맥락에서 퀴어 사회관계는 성과 젠더 가능성의 다양성 자체로 만들어진다. 지금 즘이면 눈치챘겠지만, 내게 ‘퀴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정의와 상당히 다르다. 내게 퀴어는 자치실천 실험을 통해 일어난다.
아나키즘과 아마추어리즘과 자치를 향한 욕구
퀴어 자치공간의 몇 가지 예를 들기 전, 이런 공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친 아나키즘적 실천, 그리고 아마추어 생산방식을 향한 끌림이라는 두 개념을 살피겠다. 물론 이 두 생각방식은 서로 겹치고 영향을 끼치지만, 나는 아나키즘에 영감을 받은 정치적 활동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지인 무리에서 나오는 덜 ‘정치적인’ 노력을 구분하고 싶다. 당연하지만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론과 아나키즘 이론을 자신이 관찰한 일상 속 ‘아마추어적’ 실천에 기반했다. 아나키즘과 아마추어리즘은 오랜 세월 공존했다.
유리 고든Uri Gordon(2005,2007)은 현대 아나키즘은 다양한 운동의 교차로에서 아나키즘적 가치의 부활에서 나온 “잡종 계보”를 가졌다고 지적했다(Gordon 2005:9). 이는 본 장에서 서술할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나카 퀴어 연결망의 경우 특히 그렇다[3]. 아나카 퀴어 활동가망은 반자본주의적 직접행동 정치와 초기 게이 해방의 반권위주의적 상호주의 윤리, 그린햄 코뮌Greenham Common과 사파티스타Zapatista를 비롯한 급진적 페미니즘, 환경운동, ‘거리를 탈환하라Reclaim the Streets’와 사회장social centres 운동에서 나온 실천적 경험에서 영감을 받는다. 아나카 퀴어 운동은 고든이 현대 아나키즘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당장의present-time 정치,” 즉 혁명을 진보운동 속에 자유의지주의적 정신ethos을 도입하여 지배구조와 구조적 폭력을 약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정치적관점을 함축한다.
고든 (2005, 2007)이 말하길, 근 몇 십 년간 아나키즘적 저항은 일반화돼 더 이상 국가와 자본에 가장 많이 집중하지 않고, 사회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지배(인종차별주의, 가부장재, 이성애중심주의)를 드러내고 약화하려고 한다. 아나키즘의 목적은 존재하는 정치기관의 철폐와 교체에서 사회관계의 모든 관점을 새로 정의하기로 바뀌었다.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바꾸면서 새로운 억압과 배제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에, 여러 ‘활동가’에게 있어 이 목표는 완벽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힘드리라. 하지만 이 목표는 아나키즘에 반하는 주장이 아니라 가장 평등하고 반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조성하는 과정으로써 아나키즘을 대변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래 전 엠마 골드먼Emma Gold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나키즘은 미래 이론이 아니다. 아나키즘은 우리 삶의 사건에 살아 계속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힘이다. 아나키즘은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반항하겠다는 마음이다” (Goldman 1969:63, Ferrell 2001:243이 인용함).
이런 맥락에서 전형상적prefigurative 실천은 아나키즘적 활동에 있어 큰 중요성을 얻는다(Franks 2006; Gordon 2007). 인종차별적,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나키스트가 이룩하려는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기저가 되는 사회관계를 이룩하려는 이에게 실천할 기회를 준다(Gordon 2005, 2007). 전형상적 실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해방과 사회변혁 욕구가 상호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특정 상황과 문화에 적응하는 식물의 뿌리처럼, 모든 곳에 튀어나는 실현된 경험과 문화로서 아나키즘을 촉진한다. 전형상적 실험을 (최소한 근래에 한해) 일반화하기는 힘들더라도, 실험이 가능케하는 자유의 교훈과 일견을 위해 성장을 장려함이 중요하다. 제프 페럴Jeff Ferrel이 보기엔, “자발성, 시험 그리고 장난스러운 무질서의 연습은 고전적 아나키즘의 직접행동 전략과, 제대로 실현된 포용적인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방향을 얻게 되리라는 개념을 현대 문화공간에 도입한다” (Ferrell 2001:237).
외부 권위에 기대지 않고 권력과 억압의 형태에 맞서고 약화하는 확장하는 직접행동 전술 외에도, 자치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간접 행동을 향한 경향성도 나타난다(McKay 1998:9). 이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물러나고 그 규범과 규범을 유지하는 행동을 취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 (Scott 2009).
데이비드 그래버David Graeber가 제안했듯이, 아나키즘은 “국가 권력을 취하기보다 지배구조를 드러내고 권력의 정당성을 빼앗고 허무는 것,” (Graeber 2002:62) 이라면, 아나카 퀴어 실천은 레즈비언과 게이 정체성을 되찾기보다 신자유주의 경제 내 소외된 성정체성의 소비와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드러내고, 정당성을 빼앗고 허무는 것이다.
퀴어이건 아니건, 현대 아나키즘적 실천은 “실행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재생산하는 혁명은, 고역과 지배의 전략에 기반한 혁명은, 옛 주인과 다를 바 없는 새 주인을 제시하는 혁명은 아무런 혁명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Ferrell 2001:23) 창의적이고 장난스러운 저항과 전형상의 형식을 제시한다. 엠마 골드먼과 초기 IWW(세계산업노동자연맹)와 같은 이전 세대의 아나키스트처럼, 그리고 현대의 너무나 많은 주류 게이 정치인과는 대비되게, 많은 퀴어 대중은 거의 항상 존중받기를 선호하면서도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한다.
아나키즘적 직접행동 원칙은 상호부조 윤리로서 “직접하기do-it-yourself”이다 (ibid.). 현대 DIY 문화는 펑크와 스키플Skiffle[4]과 같은 초기 풀뿌리 문화운동에 기반한 아마추어 생산의 일환이다(McKay 1998; Spencer 2005).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잡지를 만들거나, 자기자신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 타인과 공유하려는” (ibid.: 11) 욕망의 표출이다. DIY 공동체 참여자는 “금전 약속에 목매지 않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이다” (Michal Cupid, ibid.: 11 인용구). 그보다도, 이들은 DIY 행사와 작품을 위해 만든 배포와 홍보 연결망을 통한 공동체에 연대 형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자가 생산 방식을 조지 맥캐이George McKay는 “자치의 문화정치”라 지칭했고 “직관적인 자유주의적 아나키즘” (McKay (1998:23, 3) 실천이라 설명했다. 맥캐이는 또한 DIY 자아실천과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중요성의 미사여구 사이 불편한 유사점이 존재함을 인정한다(ibid.: 19). 이 지적에 나는 상호부조적 상반관계와 이 연결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위계적 조직구조와 분포, 그리고 동시에 비억압적 실천과 평등 조성과 인간‧비인간계를 아우르는 보살피는 윤리적 헌신 속에 이 둘 사이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윤리적 헌신이 DIY 문화 연결망을 다른 모든 아마추어 생산과 구분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노력은 아나키즘적 윤리에 있어 중요한 여러 특징을 포괄한다. 전문적 특수화보다 기술공유를, 위계보다 유동성과 수평적 조직화를, 그리고 소외된 노동의 효율보다 장난기 넘치는 비효율의 축복을 촉진한다. 아마추어리즘의 윤리는 또한 ‘활동가’라는 갈수록 특수화되는 역할에 대안을 제공하고(Bobel 2007; Heckert 2002), 작곡 같은 자치생활 양식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실제로 아래 다룰 여러 DIY 퀴어 공간은 현대 아나키즘적 대항과 전형상적 실험에 익숙한 ‘활동가’ 개인과 공동체가 만들었다. 하지만 최소한 예시 한 곳에서는 누구도 ‘활동가’ 또는 ‘아나키스트’로 정체화하지 않는 친구 모임이 무언가 할 수 있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음을 깨달아 이뤄낸 공간이다.
퀴어 자치 순간 탐구
이제 퀴어 자치공간을 조직하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예시를 다루겠다. 이로서 자치공간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퀴어 자치의 순간이 다른 상황에서도 발현할 수 있는지 보려 한다. 자치공간은 다른 자치공간과 분리되지 않았다. 여러 자치공간은 서로 교차하고 관계를 갖는다. 많은 참여자는 공간 사이를 오갔고, 각 공간을 특정한 필요를 충족하려고 이용했고, 한 곳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곳의 형성과 부활을 위해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표면상 서로 비슷해 보이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석 이후, 대비되는 농촌‧영적 공간에 집중해 서로 다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간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주류 문화로부터 의도해서 거리를 두려 하는 도시의 공간을 살펴본 뒤, 주류 게이 무대보다 더 복잡하고 유동적인 여러 DIY 퀴어 음악과 클럽 업소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 동성 성관계를 연구하다 관찰한 퀴어 자치의 자발적 발생 사건을 기억해내 이로부터 몇 가지 가능한 퀴어 자치 형태의 제안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공간은 일정 선까지 ‘아마추어’ 생산 과정과 관계에 기반한다.
퀴어폭동Queer Mutinies
10년 전, 1990년대 초 격찬 문화가 절정에 달했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환경 직접 행동이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끈 이후, 그러나 시애틀과 장렬한 정상회담 수렴기 이전 시기에 맥케이는 “DIY 문화가 소외된 목소리를 잠재우고 다양성을 없애고, 동시에,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요란한 포용성의 선전으로 소외를 이뤄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맥케이 1998:45).
맥케이는 계속해서 1990년대의 DIY 공동체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대중과 문화가 명백히 비가시화됐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맥케이는 부분적으로 옳았다. 이 논평이 출판된 해에 런던의 어느 아나카 퀴어 조직이 상업 게이 무대의 진부함에 대해 DIY 대안을 제공하고, 당시 시위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기술을 끌어 모으고 공유하고, 운동에서 경험했던 동성애혐오와 마초주의machismo에 대항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최초의 퀴어반란Queerruption모임을 조직했다 (Wilkinson 2009).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국제 퀴어반란 모임이 (아무 모임이 없었던 2000년과 같은 해 2번 개최된 2000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열렸고, 지금까지 3개 대륙에 걸쳐 9개 도시에서 개최됐다(Vanelslander 2007). 모임 대부분은 무단점유한 장소에서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무단점유 문화가 없거나, 당국의 불필요한 이목을 끌어 참여자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 장소를 빌렸다. 모임 비용은 주최측과 과거와 미래 참여자가 주최 도시에서 개최한 모금행사로 모았다. 각 모임의 주 행사는 약 일주일 동안 이어졌으며, 기술을 공유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정치‧윤리 쟁점을 다룬 연수회와 집회, 직접행동, 그리고 당연하지만 축제로 이뤄졌다. 숙박은 보통 행사장소에서 해결했고, 각 일자의 대부분의 시간은 값싸고 영양가 높은 비건 음식(그리고 케익!)을 준비하기 위한 물류작업에 할애하곤 했다[5]. 대부분의 모임에서 당일 우선순위는 합의를 기반한 최대한 많은 참여자와 함께하는 조기회의로 결정했다. 가끔은 합의 과정이 느리고 짜증스러웠는데, 비영어권 참여자를 위한 통역까지 더하며 그 과정은 더욱 느려지기도 했다 (다만 아쉽게도, 이 모임에서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간소화 기술을 능동적으로 공유했고, 한 모임에서의 교훈은 다음 모임으로 전이됐다. 퀴어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복되는 기쁨과 갈등과 불만족을 나는 다른 곳에서(Brown 2007a, 2007b) 기술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본문에서 기술할 가치가 있는 (특히 ‘아나키즘과 섹슈얼리티’ 학회에서 본 논의 이후 언급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모임에서의 성과 성 급진성의 상정된 중요도를 두고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은 대부분의 모임의 끝에 일어나는 성축제sex party를 둘러싸기도 하지만, 일상의 단조로움을 잠깐 벗어 때 나올 수 있는 성적으로 격앙된 분위기로 인한 것도 있다[6]. 이 활동가 연결망을 구성하는 많은 이들은 ‘급진적 퀴어’를 비非일부일처제와 폴리아모리와 여러 BDSM과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 옹호와 동일시하곤 한다. 일부 참여자에게 이런 성 윤리와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의 경계선을 강요함은 위협적이고 배제적이다. 추후 모임에서는 이런 성긍정적 윤리의 맥락에서 상호부조와 다름의 감수성을 수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ouhani 출간예정).
퀴어봉기와 같은 행사는 건설적인 직접행동의 특별히 퀴어적인 방식 –여러 나라에서 모인 급진적 퀴어가 짧은 기간 동안 정보와 기술과 공동체를 공유할 수 있는 집합점(Routledge 2003, 2005) – 을 제공한다(Day 2005). 사회규범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닌 ‘안락함과 자결권을 제공할 만큼 잘 짜였으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할만큼 느슨한,” “상호 관계와 탐험을 위한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제공한다(Ferrell 2001:32).
이런 아나카 퀴어 활동가 연결망의 중추가 된 또 하나의 공간적 실천은 주류 프라이드 축제에 대한 개입과 대안적 자유 풀뿌리 공동체 행사 주최를 통해 작용한다. 영국과 북미와 호주에서 이런 개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 공동체 말소와 부당함과 경찰폭력에 대항한 항쟁으로써 정치적인 공동체 행사였던LGBT 프라이드 행진이 기업과 지역‧전국 당국이 자신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과시하고 관광산업을 격려하는 현대 도시행사로 변질된 현상 때문에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런던 퀴어폭동과 샌프란시스코 ‘게이수치Gay Shame’와 맨체스터 ‘앙증맞은프라이드Twee Pride’와 같은 행사는 지역의 퀴어 활동가가 LGBT 프라이드 행사의 상품화를 장난스럽게 풍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공간의 능동적 창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 대안을 위한 소규모 예시를 증명한다.
위 예시는 소규모 ‘아마추어’ 집단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지 보여준다. 과정에서, 많은 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비록 행사를 주최하기란 힘들지만,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함께 쉬고 놀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공간을 제공한다[7].
농촌만남 Rural encounters
위는 도시 내 정치적 공간의 예시였다면, 다음은 농촌에서의 퀴어 자치공간을 탐구해보려 한다. 정치를 목적으로 모인 활동가공간으로 주제를 한정하면, 2005년 글랜이글 G8 정상회담과 2007년 하일리겐담Heiligendam 정상회담에 반대하며 모인 ‘퀴어 동네queer barrios’나 이후 열린 여러 ‘기후학교Climate Camp’가 있다. 하지만 나는 보다 영적인 퀴어 공간을 고찰하고 싶다. ‘퀴어이교도학교Queer Pagan Camp(QPC)’ 자체를 혁신으로, 그리고 ‘급진요정Radical Faerie’ 모임과의 교차의 맥락에서 생각하고 싶다. 이 공간 모두 완전히 아나키즘적이지는 않지만, 비권위주의적, 직접하기 행동양식을 통해 영적 퀴어 실천을 탐방하는 자치공간이다. ‘급진요정’은 게이 활동가 해리 헤이Harry Hay의 생각과 열정 덕분에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단, 비록 해이가 급진요적을 창설했지만, 그는 게이 남성의 농촌 공동체 생활방식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오늘날 북미 전역과 서유럽과 호주에 걸쳐 급진요정 조직과 안식처가 퍼져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대 아나카 퀴어 운동이 복합적인 계보를 거슬러 오르듯이, 헤넌Hennen이 증명하는 것처럼, 급진요정 또한 그러하다.
급진요정 문화는 맑스주의, 페미니즘, 이교도, 북미원주민과 뉴에이지 영적문화, 아나키즘, 남성운동의 시와 설화, 급진적 개인주의, 자아실천의 치료적 문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지하는 지구기반 운동, 게이해방과 드래그drag등의 놀라울 만큼 다양한 문화 연장통을 지니고 있다. (Hennen 2004:500–1)
헤이는 나아가, 급진요정은 초기 게이 해방정치를 뒤따른 도시 게이문화의 빠른 상품화를 벗어나고 대항하려는 바램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급진요정은 1970년대 확장중이던 남성신체의 대상화와 도시 게이무대를 지배하게 된 욕망에 대한 극단적남성성hypermasculinity에 소외된 게이남성의 관심을 끌었다. 반대로 해리 해이는 ‘자아 사이 의식subject-subject consciousness’을 소양하는 윤리를 “우리는 항상 타인을 물체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자기자신과 같은 자아subject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지했다(ibid.: 513). 헤이에게 게이 남성 간 자아-물체 관계는 도시 게이생활 상품화를 뒤따른, 확장하는 ‘이성애자-모방’ 행동의 산물이었다. 헤이는 급진요정에게 영감을 받은 남성들이 만들어낸 농촌의 은거처와 모임, 그리고 공동 안식처가 퀴어 남성이 공동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했다. 비록 급진요정 모임은 영적 공간을 의도했지만, 매우 포괄적이어서 여러 영적‧무영적의 남성을 (그리고 일부 모임에서는 여성도) 끌어 모았다 –이교도, 불교, 기독교, 무신론자. 이런 영적‧윤리 가치관을 실천에 활용한 방식은 비위계적ㆍ참여적인 전형상적 자치공간에 참여하고 자본주의 이후 미래를 오늘날 실천하려는 이에게 친숙할 것이다.
참신하게도, 급진요정 문화는 결과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식사 준비부터 안식처 걸설까지, 급진요정 과제는 비효율적이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급진요정의 일원 대부분은 비효율을 선호한다. (ibid.: 502)
1998년 여름부터 영국에서 개최된 열흘에 걸친 퀴어 이교도 모임 QPC에서 비슷한 ‘문제’를 목격할 수 있다. QPC가 첫 퀴어폭동 모임과 같은 해에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처음부터, 두 연결망은 강한 유대를 가졌고, 주최측의 여러 핵심인물은 두 모임을 여러 해 조직해왔다. 많은 이들이 두 조직을 동시에 지지하고 상호 간 기술과 활동 경험 공유가 오갔다. 급진요정 무리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존재했다. QPC 소개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퀴어이교도학교는 사회 전반과 타 영적모임의 성정체성과 젠더 지향성 선입견에 소외감을 느낀 대중의 경험에 기반했다. 퀴어이교도의 제일원칙은 타인과 자기자신과, 령과 땅의 존중이다. 또한 우리는 자기정체화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QPC n.d.)
여러 이교도적 실천에 내제된 젠더 이분법과 대조되게, 위 내용은 (전언한 관계적 윤리로써 퀴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도전적 퀴어성으로의 접근이다. 도전적 퀴어 감성은 모든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대중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를 초월해, 영적 실천과 의례에 퀴어 이교도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우리는 ‘령’과 ‘자연’과 ‘마법’을 향한 여러 길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다양성을 기념한다” (ibid.).
절반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나머지 절반은 (페미니즘적, 퀴어, 그리고 아나키즘적 연결망의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윤리원칙에 의해, 퀴어이교도학교는 시작부터 참여적 직접하기 윤리를 도입했다. 비록 구성원이 학교의 여러 세부사항(예를 들어 장소 물색, 대관, 보육원과 식당 마련, 등) 준비를 책임지지만, 조직 자체는 학교 주최측이 그 해 개최하는 여러 공식 회의에 참여한다는 가정 아래 굴러간다. 학교는 합의기반 운영을 목표로 삼고, 참여자 전원은 일상적인 작업을 –장작 패기, 퇴비화장실 뒤집기, 저녁밥 짓기, 연수회와 의례 진행하기, 음악과 의상으로 학교 분위기를 돋우기 등– 책임지도록 요구받는다. QPC의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합의기반 조직방법은 지속전인 도전이자 작업 중에 있는 과제이다. 활동이 지속된 13년간 발달한 관습과 관행을 신입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직접하기 원칙에 핵심적인 즉흥적인 표현을 억제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QPC 공동체는 이러한 갈등에 반성하며 대응한다. 또한 학교의 장난끼 가득한 전통은 지나치게 진지하게 굴거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학교 운영에 있어 이런 능동적이고 비위계적인 접근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술 의례와 학생이 지향하는 초인간 세계를 대하는 윤리에 영향을 끼친다 (Abram 1996):
퀴어 이교도로서 우리는 령, 자연, 조상, (여)신 또는 다른 신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우리는 중재인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의를 통해 의례를 만든다. 우리는 위계를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령을 환영하고 협업한다. 우리는 령을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전통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만든다. 젠더의 솥을 젓는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주술에 제한받지 않는다. 우리는 정신精神력과 함께할 수도, 우리 자신의 치유자, 축복자와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근사한 옷가지와 화려함을 동반한다! (QPC n.d.)
비록 QPC 연수회는 다양한 이교도 전통의 핵심 신념과 실천을 공부할 유용한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다양한 곳의 전통을 차용하고 –엘란élan학교의 경우– 너무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립스틱 계몽’과 ‘프랜스 춤prance dance’은 근 몇 년 동안 기억될만한 예시이다. 주술과 의례에 이런 퀴어 접근은 QPC 참여자가 해마다 경험한 포괄적, 비위계적이고 자치적인 생활방식의 결과로만 나올 수 있었다.
산업무대의 경계에서 자치
앞선 두 예시와 다르게, 퀴어 자치는 상업 게이무대 밖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류 공간과 전언한 자치공간 모두와 더욱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여러 공간도 있다. 1970년대 펑크의 비상飛上 이후, 자신의 음악적 취향에 맞지 않는 게이 바와, 성적 다향성에 언제나 개방적이지 않은 펑크 공동체 사이에 길을 잃은 여러 게이 펑크 대중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두 하위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양쪽의 부분 환영을 받던 게이 펑크 대중의 경험은 퀴어성향queercore 음악과 공연무대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인터넷의 발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퀴어 직접하기 연결망은 세계 북반구에 걸쳐 확산됐다. 미국 서부해안의 퀴어성향 무대에서 장기간 활동한 래리 봅Larry Bob에게 퀴어성향은 다양한 배경의 창작자와 협동할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대중유희는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존재한다. 퀴어성향은 그렇지 않다. 대중은 퀴어성향이 제공하는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든다. 너무 작은 틈새문화여서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 (Larry Bob, Spencer 2005:281인용)
DIY 퀴어 무대는 대중에게 젠더와 화폐와 검열에 대항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덕분에 행사는 저렴하고, 가끔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와 아마추어 공연가(이들은 단골과 단골의 지인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를 홍보하고 상업적 주류문화의 틈새시장보다 넓은 범위의 성‧젠더 다양성을 포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주 노력한다. 하지만, 지인 인맥에 의존하는 공연과 모임에는 작은 무리가 지배하고 포괄적인 의도를 무산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Culton and Holtzman 2010; Jindal 2004).
근 몇 년 영국에서 퀴어 유희로 직접하기 접근은 ‘클럽패그Club Fag’ (카디프), ‘카페퀴어리아Kaffequeeria’(맨체스터), ‘호모범죄Homocrime,’ ‘마르지않은춤Unskinny Bop’과 ‘아나키스트 여성 소란 카페Women’s Anarchist Nuisance Café (WANC{1})’ (런던), 그리고 ‘머라든지 클럽Club Wotever’ (런던 버밍엄, 그리고 가끔은 유럽 전역의 대도시에서도 열린다)을 통해 유지됐다. 일부 행사는 무단점거한 장소와 사교모임장에서 개최되고, 일부는 한가한 주중에 이성애자 모임장소에서 개최하려고 협상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특히 ‘머든지 클럽’은) 기존의 주류 레즈비언과 게이바 기반을 활용하기도 한다. 모두 비영리 행사이고, 행사 주최에 있어 청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활동가 무리의 열정에 의지한다.
‘호모범죄’는 그 자체의 재미와 퀴어성향 아마추어 음악가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됐다. ‘모든 성적지향과 젠더의 퀴어’를 위한 안전 공간처럼 소개됐다. ‘호모범죄’ 행사는 2달에 한번 (‘마르지않은춤’ 행사와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로파이lo-fi 음악가와 공연인이 자신을 선보일 기회였고, 각 행사는 관계된 음악가의 3인치 CD-R 음반의 발표와 같은 날에 열리도록 계획됐다. 행사의 직접하기 성향 때문에 이 CD는 어쩔 수 없이 기한에 맞춰 발매하지 못하곤 했고 공동체는 이런 작품이 끼칠 수 있는 영향에 현실적이었다:
싱글즈 모임Singles Club에 참여하는 건 ‘호모범죄’에 있어 제가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재능 있고 가식 없는 친구가 넘쳤고 그들의 음악이 ‘저 밖으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침실로) 퍼지도록 도울 수 있는 건 무척 좋았습니다. (Daniel, Homo crime 2006:5)
모임의 친근하고 적극적인 청중은 많은 참여자도 (자신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도록 자극했다. 연주는 비록 엉망이었지만, 청중은 항상 열정적이었고 지지를 표했다.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마르지않은춤’의 디제이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호모범죄’는 대부분의 게이 모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악과,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친구들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로파이와 직접하기 생산 가치관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었던 반면, ‘마르지않은춤’은 온전한 음악 감상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다:
‘마르지않은춤’은 모든 정체성과 성향의 남녀를 무대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대가 모든 걱정을 떨치고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비웃음과 불쾌한 말을 듣지 않고 춤출 수 있는 기쁨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그렇듯이, 인생에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Unskinny Bop, n.d.)
‘머라든지 클럽’은 비록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지만, 게이 모임을 지배하는 이성애중심적 젠더 이분법을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직접하기 충동으로 시작했다. ‘머라든지 클럽’의 아마추어 공연인과 청중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의상을 입고 모임으로써 주류공간과 차별되는 대안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는 모두를 흥겹게 반깁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모두와 어울리도록 말입니다. 이곳은 포용적인 공간이고 저희는 저희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는 모든 젠더와 성적지향과 표현에 대해 개방적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Club Wotever 2007)
또렷한 소비자‧생산자 구분을 둔 상품화된 공연장의 배타적 성향을 초월하는 자치공간을 만들려는 공동체의 참여적 창의력이 암시된 정치는 WANC 웹사이트에 올라온 성명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웹사이트에도 퀴어 페미니즘적 자치를 위한 전형성적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웃음을 공유하는 행위의 정치적 중요성은 강조된다:
여성 카페는 음악과 요리와 식사와 웃음의 힘을 모든 배경과 사회계층의 여성을 이해하고 연대하고, 우리들의 섹슈얼리티나 계층으로 인해 서로 다른 점을 끝내거나 기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유가 작동하는 모든 공간에서처럼, 무엇이든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이곳은 모두가 인정받는 친화적 공간이다. 이 카페는 도심의 파편화된 생활양식에서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에게 뿌리를 주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 자체로 정치적 성과이다! (WANC website, www.wanc-cafe.org.uk)
본 장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의 조직가는 아나카 퀴어 활동 퀴어봉기 연결망과 친밀하고 이중 여럿은 관련된 다른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경험이 있다. 이 모든 유흥사업 중, 아마도 WANK가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가장 당연한 연결점을 갖는다. 활동가를 사업과 그들이 직접행동이나 집회에 참여하며 생긴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모금 사교모임을 조직한바 있다.
초기 WANC 행사에서 알더마스턴 여성 평화 켐프Aldermaston Women’s Peace Camp의 여성들은 점거농성 기술전파를 위한 연수회를 열었다. 비슷하게, 야간 테마카페는 근처 공원에서 나무를 타고 상수리 놀이 대회를 연 ‘톰보이 밤’ 같이, 보다 즉석적이고 즉흥적인 유흥형태로 발전했다. 참여자는 또한 카페가 개최된 장소에서 넘쳐나와 공공장소로 행위적 개입을 하기도 했다. 플랑멩코 테마 카페의 참여 여성이 거리로 나와 ‘황소 달리기’를 한 것이 그 예다.
비록 전통적 남성 게이 매체에서 이런 모임의 존재는 대체로 무시됐지만, 레즈비언 매체의 일부는 ‘머라든지 클럽,’ WANC와 ‘마르지않은춤’의 존재를 전통적인 레즈비언 모임장의 대안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WANC가 퀴어봉기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자치공간의 형태를 가장 잘 유지했다면, ‘머라든지 클럽’은 반면에 레즈비언과 게이 상업무대의 경계선에서 자리잡았다. 이런 모임과 카페는 무단점거한 공간과 재활용한 자제와 남겨진 음식을 사용한 모임부터, 좀 더 상업적인 거래와 회사 같은 조직을 유지하는 모임까지, 다양한 자치형태를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업적 게이 무대가 충족하지 못한 필요와 욕망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아마추어 직접하기 충동에서 시작했다. 이 공간은 전부 비영리를 기반해서 운영된다. 나아가 청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격려해 단순한 상품의 소비자가 아닌 공간의 공동개최자로 참여하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자치 퀴어 지리에 존재한다.
자치 가사家事
내가 몇 년 전 이스트런던의 남성이 번개만남을 갖던 어느 공중화장실에서 목격한 몇번의 찰나의 자발적 행동을 마지막 예시로 들겠다(Brown 2008). 이런 장난기 넘치는 모임은 니젤 트리프트Nigel Thrift가 관찰한 “놀이의 범주를 넓히기 위해 생물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최종 목표가 되는” 애정과 보살핌 정치를 위한 가능성을 향해 가리킨다(Thrift 2004b: 70). 이는 요구나 권리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지배 체제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남과 관계에 기회를 주는 정치”이다 (Thrift 2004a: 84).
다음 사건에서 ‘보살핌’을 향한 이 충동이 희미하게 보인다. 사건은 번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의회가 몇 주 동안 공중화장실 청소를 소홀히 했던 시기의 던 어느 고요한 밤에 일어났다. 화장실 방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번개를 찾는 남성의 배회가 끊긴 와중, 한 작은 단골 친구 무리가 변기에 주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들은 수행원의 사무실에 들어가 세제와 걸레, 양동이 두 개를 꺼내어 철저히 청소를 시작했다.
이런 자치적 ‘가사’에 당시 나는 흥미를 느꼈다. 이는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미있고 전략적인 공간에 대한 애정의 표현에 다른 의미로 난 감동받았다. 존 비니John Binnie (2001)와 폴 할람Paul Hallam(199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런 공간 특유의 더러움이 기여할 수 있는 성적 매력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 화장실은 에로틱한 장소를 넘어선 음울한 장소로 바뀌고 있었다.
그 결과, 이 공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접근이 중단될 위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의 많은 이용자는 장소를 버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이 그렇지 않은 밤보다 더 많았다. 스스로 공간을 청소함으로써, 이 공간을 돌본 친구 무리는 이곳의 (버려진 공중화장실과는 대조되게) '화장실'로서의 기능 지속을 보장하고 있었다. 무리의 돌봄 행위는 남성 간의 연애 만남의 가능성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 공간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드러낸다(Brown 2008). 번개 만남을 즐기는 이들은 공중성행위를 위해 용인할 수 있는 더러움 정도를 절실히 안다. 이 전략적 공간을 돌보면서, 나는 남성들이 공간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자율성을 주장했다고 믿는다.
2001년 가을부터 화장실이 끝내 장기 폐쇄된 2004년까지, 번개만남을 찾는 사람들과 경찰 및 지방의회과 화장실이 공중성행위 장소로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다. 의회는 장소를 일찍 닫거나 긴 시간동안 폐쇄하는 시도를 했다. 경찰은 화장실 앞으로 주기적인 야간순찰을 나왔지만, 방문하는 남자이 잠시 자리를 뜨거나 번개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외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부 지역 주민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 의회가 화장실 운영 조기종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때 직접 자물쇠를 채우거나 방문객을 협박했다. 이에 대항해 여러 단골 번개 참여자는 화장실을 점거하거나 욕설을 무시하거나 항의하는 지역주민에 직접적으로 대립하며 능동적으로 화장실을 방어했다. 화장실 문이 잠길 때는 종종 건물을 무단점거하곤 했다:
계단을 내려가니 공간이 바뀌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 설치됐지만, 한 번도 닫힌 걸 본적이 없는) 계단에 수평하게 쳐진 덧문은 덤이요, 이제는 계단 아래에 매우 간단한 ‘문’이 설치됐다. 문은 경첩에 연결한 거칠게 다듬어진 합판에 지나지 않는다. 문은 일몰 이후 퀴어 쾌락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로 수차례 강제적으로 뜯겨 쓸모를 다해, 다른 모든 ‘안전’ 조치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Field note: The Toilet, 3 August 2002).
물론 번개를 찾는 이용객의 당당함에 화장실이 공중 성행위 장소로 알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폐쇄를 앞당겼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다른 무언가도 추가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쾌감의 공간을 방어한 이 남자들은 자치공간을 주장했다. (다른 맥락에서는 이성애중심적인)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활동가 연결망의 노력을 초월하는 자치정치를 함의한다. 이 남자들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용공간을 차지해 자신의 자치를 표현하고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드러나도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페럴이 브레흐트를 인용하며 말한 바와 같이, “공용공간을 불법화하는 것과 무법자에게 공용공간을 개방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악랄한가?” (Ferrell 2001:224).
이 쾌락 정치를 방어하기 위한 소규모 동원은 공중 성행위 장소와 성행위를 통해 지속되는 “사랑과 우정의 실험실”을 점증하는 비관론에 대항하는 작은 희망을 제공한다(Bell and Binnie 2000:132).
비록 오늘날 수는 과거에 비해 적지만, 공중성행위 공간과 야외 번개만남 장소는 계층과 인종 구분을 넘나드는 공동체를 위한 비상업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 공간에서 말보다 행동이 무게 있고, 엄격한 성정지향과 사회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약화하는데 사용된다. 가장 잘 자리잡은 공간에서 이런 공동체적 성향은 자율적 존재양식의 형태를 갖기 시작해 도시 구조에서 생활하고 퀴어 사이 퀴어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미래 퀴어 도시생활
비록 앞선 네 가지 예시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의 행사와 공간을 설명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의 삶에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 때문에 모인 친구 무리로 시작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직접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됐다. 그 결과, 이 공간은 상품이 아닌 직접 경험이 됐다. 물론 문제가 없진 않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공간 속에 존재하고 지속하는 갈등과 문제를 살펴보고, 현대 도시공간 내 자치적 퀴어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가능성도 도출하려 한다. 과정에서 ‘아나키즘과 섹슈얼리티’ 학회에서 다룬 폭넓은 퀴어 자치공간 논의를 끌어내겠다. 이 학회의 참여자는 자신에게 소중한 공간 내의 한계와 배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우려를 언급했다. 참여자는 서유럽과 북미에서 너무 많은 퀴어 자치공간이 지나치게 ‘백인 지배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고(Jindal 2004; Starr 2006; cf. Kuntsman and Miyake 2008) 40대 이상의 구성원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또 누구는 퀴어 자치 실천을 위한 시도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식돼 ‘활동가 게토ghetto’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했다(Anonymous 2000a, 2000b). 일부는 몇몇 활동가가 한 지역에서 개발된 퀴어 자치 약식을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문화‧정치적 맥락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고 이식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퀴어 자치 시도를 이식하는 한계에 관해, 일부 참여자는 퀴어봉기 모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쾌락주의와, 경박함과 성 긍정적 쾌락이 모든 지리적 맥락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실제로, 일부 활동가는 전쟁지역에서의 성축제 개최를 지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06년 텔아비브Tel Aviv 퀴어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연히 또 누구는 바로 그런 퀴어적 패기가 전쟁 중에 필요했다고 단언했다). 물론, 전언한 바와 같이, “성 급진주의”의 공개적인 실천은 몇몇 연대자가 퀴어이고 아나키즘적 사회적 정치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적 윤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난감하고, 모욕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 비록 위 우려 중 일부는 퀴어 공간에 한정되지만, 자치적 생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비슷한 문제를 마주친다.
자치성을 주장하고, 외부 규범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재진행형 과정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피커릴과 채터튼은 영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 사회 모임장의 연결망을 두고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지식과 능력에 있어) 내부 위계와 포용‧배제의 경계의 문제는 사회적 모임의 장에서 계속된다. 많은 참여자는 외부인의 인식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대중이 이런 모임을 게토로 봐 참여를 꺼리는 것일까? 일상의 문제와 정말로 연관된 것일까? 대중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것이 쉬운가? 이런 문제에 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다루는 것이 자치의 주춧돌이 된다. 틈새에 사는 것은 창의력과 혼합과 유연성과 유동적인 정체성의 원천이 돼 우리를 지배하는 규범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가능성을 창조한다. (Pickerill and Chatterton 2006:742)
도심 (또는 농촌) 공간의 변화는 그런 환경 속 일상의 변화와 뗄 수 없다(Pinder 2005:3). 데이비드 벨이 제안하길, 퀴어 도시는 도시 삶에 (간신히) 담긴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자생적 가능성’과 대중의 욕망과 삶의 경험 사이의 거리를 활용함으로써, 지금 당장 도시의 용도에 작은 수정을 통해 새로운 퀴어 사회의 형태를 드러내고 그 역도 가능케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한 공간과 만남은, 비록 아나키즘적 이론의 직접적인 영향과 자각된 영감을 받지는 않았어도, 더 많은 대중이 자신과 타인을 다양한 자치적인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안내문을 제공한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 생활양식을 위한 실험은 자칭 활동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친구 무리의 폭넓은 아마추어적 시도를 통해 시작해 더 많은 대중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 실천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아마추어적 실험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답이 없음에도 보다 자치적이고, 평등하고 자애로운 사회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시한다. 실제로, 이 접근은 단일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험와 변화와 적응의 끊임없는 과정을 선호한다. 도심에 더 많은 퀴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다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는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선 관찰과 발달의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공간의 기능은 그것을 둘러싼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인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퀴어의 윤리적 헌신이 인간이 아닌 사물과 개체에게도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J.K. 깁슨 그래험(2006:81)은 다양한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이후 사회관계에 대한 상상력 풍부한 자신의 작품에서 “공유물commons”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이 과정은
함께 사는 것이자, 물질적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경계선을 결정하는 윤리의 실천이다. 공유물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관리하고 보충해야 하는 공동체의 소유로 볼 수 있다 (Gibso n-Graham 2006:96–7).
내가 보기에,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퀴어 자치공간 (또는 모든) 예시는 대안적 공동체 생활양식을 양성하고, 참여자에게 쉴 공간을 마련하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지배받지 않는 유흥과 보살핌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중요한 공유물이다 (Brown 2009). 따라서, 우리는 이 공간을 방어하고 확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퀴어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책임감, 상호관계, 공동체주의와 상호주의” (Chatterton 2006:261)를 양성하는 사회관계를 지지하는 공간을 기반했으면 한다. 자치 퀴어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앞에 놓인 어려움은 타인에게 우리들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상像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에게 자신만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Hern 2010).
나는 다양한 퀴어공간을 특정한 ‘급진적’ ‘게이 게토’에 집중하는 것보다 도심환경 전반에 대한 확장을 장려하고싶다. 이 포용성에 대한 초대장은 변두리 공간과 정체성과 실천의의 가치와 생산성에 맞춰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영속농업 원칙에 따라 농경하는 이들은 (Whitefield 2002) 다양한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숲의 경계라던가 해변가를 따라 놓인 바위 웅덩이, 등)은 매우 비옥하고, 획기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퀴어 공간은 이런 “변두리 효과”를 활용하고 있고[8], 그렇게 지속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한 공간에 집중하고 통합하기 보다, 도시 곳곳에 퀴어 공간의 모자이크의 확산을 장려한다면, 퀴어 대중은 도심의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며 생산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City Repair Project 2006). 이것이 다양한 퀴어 생활양식을 이끌어내 오늘날 상업적 게이 무대나 현존하는 활동가 연결망에 존재하는 양식의 한계를 초월하기를 희망한다. 이미 실재하는 아마추어 연결망에서 보이는 가능성을 나는 믿는다.
번개만남을 찾는 이들이 도시의 거리와 건물과 공용공간이 특정한 마음상태와 공명하고, 자신들의 에로틱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처럼, 퀴어 도시 거주자 또한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신들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를 활용하고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퀴어 도시 공간의 생성과 재생성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Chatterton and Hollands 2003), 퀴어는 직접 체험하고 상상하고 퀴어 자치생활을 위해 재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데 노력할 수 있다.
Abram, D. (1996) The Spell of the Sensuous, New York: Vintage Books.
Anonymous (2000a) ‘Give up Activism’, Do or Die: Voices from the Ecological Resistance 9: 160–6.
——(2000b) ‘Give up Activism: Postscript’, Do or Die: Voices from the Ecological Resistance 9: 166–70.
Bell, D. (2001) ‘Fragments for a Queer City’, in D. Bell, J. Binnie, R. Holliday, R. Longhurst and R. Peace (eds), Pleasure Zones: Bodies, Cities, Space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Bell, D. and Binnie, J. (2000) The Sexual Citizen: Queer Politics and Beyond, Cambridge: Polity Press.
Binnie, J. (2001) ‘The Ero tic Possibilities of the City’, in D. Bell, J. Binnie, R. Holliday, R. Longhurst and R. Peace (eds), Pleasure Zones: Bodies, Cities, Space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Bo bel, C. (2007) ‘“I’m No t an Activist, Tho ugh I’ve Do ne a Lo t o f It”: Do ing Activism, Being Activist and the “Perfect Standard” in a Contemporary Movement’, Social Movement Studies 6(2): 147–59.
Brown, G. (2007a) ‘Autonomy, Affinity and Play in the Spaces of Radical Queer Activism’, in K. Bro wne, J. Lim and G.
Brown (eds), Geographies of Sexualities: Theory, Practices and Politics, Aldershot: Ashgate.
——(2007b) ‘Mutinous Eruptions: Autonomous Spaces of Radical Queer Activism’, Environment & Planning A 39(11): 2685–98.
——(2008) ‘Ceramics, Clo thing and Other Bo dies: Affective Geo graphies o f Ho mo ero tic Cruising Enco unters’,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9(8): 915–32.
——(2009) ‘Thinking beyond Homo normativity: Performative Explorations of Diverse Gay Economies’, Environment & Planning A 41: 1496–510.
Brown, G. and Pickerill, J. (2009) ‘Space for Emotion in the Spaces of Activism’, Emotion, Space and Society 2(1): 24–35.
Castoriadis, C. (1991) Philosophy, Politics, Autonomy: Essays in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atterton, P. (2006) ‘“Give Up Activism” and Change the World in Unknown Ways: Or, Learning to Walk with Others on Uncommon Ground’, Antipode 38(2): 259–81.
Chatterton, P. and Hollands, R. (2003) Urban Nightscapes: Youth Cultures, Pleasure Spaces and Corporate Power, London: Routledge.
City Repair Project (2006) The City Repair Project’s Placemaking Guidebook: Neighbourhood Placemaking in the Public Right-of-Way, Portland, OR: City Repair Project.
Club Wotever (2007) Wotever World. Online. Available HTTP: http://www.wo tever-wo rld.co m (accessed 28 April 2010).
Culton, K. R. and Holtzman, B. (2010) ‘The Growth and Disruption of a “Free Space”: Examining a Suburban DIY Punk Scene’, Space and Culture 13(3): 270–84.
Dark Star (eds) (2002) Quiet Rumours. An Anarcha-feminist Reader, Edinburgh/Oakland, CA: AK Press/Dark Star.
Day, R. J. F. (2005) Gramsci is Dead: Anarchist Currents in the Newest Social Movements, Lo ndo n/Ann Arbo r, MI: Pluto Press.
Ferrell, J. (2001) Tearing Down the Streets: Adventures in Urban Anarchy, New Yo rk: Palgrave Macmillan.
Franks, B. (2006) Rebel Alliances: The Means and Ends of Contemporary British Anarchisms, Edinburgh/Oakland, CA: AK Press.
Gibso n-Graham, J. K. (2006) A Postcapitalist Poli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o rdo n, U. (2005) ‘Anarchism and Political Theory: Contemporary Problems’, unpublished DPhil thesis, University of Oxford. Online. Available HTTP: http://zinelibrary.info/files/anarchismpoliticaltheory.pdf (accessed 6 January 2011).
——(2007) Anarchy Alive! Anti-authoritarian Politics from Practice to Theory, Lo ndo n: Pluto Press.
Graeber, D. (2002) ‘The New Anarchists’, New Left Review 13: 61–73.
Hallam, P. (1993) The Book of Sodom, London: Verso
Harvie, D., Milburn, K., Trott, B. and D. Watts (eds) (2005) Shut Them Down! The G8, Gleneagles 2005 and the Movement of Movements, Leeds: Dissent! and Autono media.
Heckert, J. (2002) ‘Maintaining the Bo rders: Identity and Po litics’, Greenpepper (Autumn): 26–8.
——(2004) ‘Sexuality/Identity/Po litics’, in J. Purkis and J. Bo wen (eds), Changing Anarchism: Anarchist Theory and Practice in a Global A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Hennen, P. (2004) ‘Fae Spirits and Gender Tro uble’,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3(5): 499–533.
Hern, M. (2010) Common Ground in a Liquid City: Essays in Defense of an Urban Future, Edinburgh/Oakland, CA/Baltimo re, MD: AK Press.
Ho dkinso n, S. and Chatterto n, P. (2006) ‘Auto no my in the City? Reflectio ns o n the So cial Centres Mo vement in the UK’, City 10(3): 305–15.
Hollo way, J. (2002) 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 Lo ndo n: Pluto Press.
Homo crime (2006) Homospective (self-produced zine; available from the author).
Jindal, P. (2004) ‘Sites of Resistance or Sites of Racism?’, in Mattilda Bernstein Sycamore (ed.), That’s Revolting! Queer Strategies for Resisting Assimilation, New York: Soft Skull Press.
Knopp, L. (1992) ‘Sexualit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Capitalism’,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10: 651–69.
Kuntsman, A. and Miyake, E. (eds) (2008) Out of Place: Interrogating Silences in Queerness/Raciality, Yo rk: Raw Nerve Books.
McKay, G. (1998) DiY Culture: Party & Protest in Nineties Britain, Lo ndo n: Verso .
Nast, H. J. (2002) ‘Queer Patriarchies, Queer Racisms, internatio nal’, Antipode 34(5): 877–909.
Olesen, T. (2005) International Zapatismo: The Construction of Solidar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Lo ndo n: Zed Books.
Peace, R. (2001) ‘Pro ducing Lesbians: Cano nical Pro prieties’, in D. Bell, J. Binnie, R. Ho lliday, R. Lo nghurst and R. Peace (eds), Pleasure Zones: Bodies, Cities, Space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Pickerill, J. and Chatterto n, P. (2006) ‘No tes to wards Auto no mo us Geo graphies: Creatio n, Resistance and Self-management as Survival Tac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6): 730–46.
Pinder, D. (2005) Visions of the Ci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o vinelli, E. A. (2006) The Empire of Love: Towards a Theory of Intimacy, Genealogy and Carnality ,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QPC (n.d.) ‘Why Queer Paganism? ’ Online. Available HTTP: http://www.queerpagancamp. o rg/ (accessed 28 April 2010).
Quilley, S. (1997) ‘Co nstructing Manchester’s “New Urban Village”: Gay Space in the Entrepreneurial City’, in G. B. Ingram,
A.-M. Bo uthillette and Y. Retter (eds), Queers in Space: Communities/Public Places/Sites of Resistance, Seattle, WA: Bay Press.
Rouhani, F. (fo rthco ming) ‘The Richmo nd Queer Space Pro ject: Building Bridges o ver Chasms We Create’, ACME: An International e-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Ro utledge, P. (2003) ‘Co nvergence Space: Pro cess Geo graphies o f Grassro o ts Glo balizatio n Nnetwo rk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 333–49.
——(2005) ‘Grassro o ting the Imaginary: Acting within the Co nvergence’, Ephemera: Theory and Politics in Organization 5(4): 615–28.
Sco tt, J. C. (2009)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Spencer, A. (2005) DIY: The Rise of Lo-fi Culture, London: Marion Boyars Publishers.
Starhawk (1997) Dreaming the Dark: Magic, Sex and Politics, Boston, MA: Beacon Press.
Starr, A. (2006) ‘Grumpywarriorcool: What Makes Our Movement So White?’, in S. Best and A. J. Nocella (eds), Igniting a Revolution: Voices in Defence of the Earth, Edinburgh and Oakland, CA: AK Press.
Thrift, N. (2004a) ‘Summo ning Life’, in P. Clo ke, P. Crang and M. Go o dwin (eds), Envisioning Human Geographies, London: Arnold.
——(2004b)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86 B(1): 57–78.
Turner, M. W. (2003) Backward Glances: Cruising the Queer Streets of New York and London, Londo n: Reaktion Books.
Unskinny Bo p (n.d.) ‘Mainfesto of Unskinny Bop’. Online. Available HTTP: http:// www.unskinnybo p.pwp.blueyo nder.co .uk (accessed 28 April 2010).
Valentine, G. (1993) ‘Nego tiating and Managing Multiple Sexual Identities: Lesbian Time–Space Strateg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8(2): 237–248.
Vanelslander, B. (2007) ‘Lo ng Live Tempo rariness: Two Queer Examples o f Auto no mo us Spac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1(1): 5–11. Online. Available HTTP: http://affinitiesjo urnal.o rg/index.php/affinities/article/viewFile/3/22 (accessed 28 April 2010).
WANC (n. d.) ‘Why WANC? ’ Online. Available HTTP: http://www.wanc-cafe.o rg.uk (accessed 28 April 2010).
Whitefield, P. (2002) Permaculture in a Nutshell, East Meon, Hampshire: Permanent Publications.
Wilkinso n, E. (2009) ‘The Emotions Least Relevant to Politics? Queering Autonomous Activism’, Emotion, Space and Society 2(1):36–43
[1] 이 관점을 학계의 성적 지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은 내가 보이려던 연결과 분석을 알아보는 이가 별로 없어 상당히 고독하게 느껴졌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나는 지지적이고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조언과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로레타 리Loretta Less, 팀 버틀러Tim Buttler, 케스 브라운Kath Browne, 제이슨 림Jason Lim, 제이미 헤커트Jamie Heckert, 케리 헤밀튼Carrie Hamilton, 젠니 피커릴Jenny Pickerill, 존 레빈John Levin과 엘라너 윌킨슨Elanor Wilkinson에게 수년에 걸친 친절한 대화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한다. 나는 또한 샘 ‘회전초’ 로버츠Sam ‘Tumbleweed’ Roberts를 추모하고 싶다. 그는 내가 한 말을 즐겼고, 퀴어 자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매우 세부적으로 들려줬지만, Leeds 학회 이후 몇 달 뒤 끔찍하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2] 내가 보기에, 홀로웨이Holloway의 “행할 권리”와 스타호크Starhawk(1997)의 “동반한 힘”의 개념 사이에 당연한 관계가 존재한다.
[3] 여성형인 아나카는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적) 활동에 대한 규범적 선입견을 교란하고 아나카 퀴어와 아나카 페미니즘적 실천 사이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Dark Star 2002).
[4] 행사에서 비건 음식은 저렴하고, 동물 착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의 영양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자주 제공된다.
[5] 이와 같은 행사에서 비건 음식은 저렴하고 동물학대를 필요하지 않으며 가장 많은 참여자 수의 식이 제한을 충족하기 때문에 흔히 제공된다.
[6] 이 분석은 어쩌면 행사에 참여한 데서 비롯한 지나치게 감성적인 내 반응에 기반했음을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가 연애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자신의 퀴어성을 드러내거나, 아직 떠올리지 못한 다른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7] 분석에 대한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모임에 참여하기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제이미 헤커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8] 영속농업의 윤리와 아나키즘과 자치를 위한 원리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오늘날의 상상 사이 당연한 관계가 보인다. 하지만, 본 장에서 이런 연관이나 퀴어 사회관계와 영속농업의 ‘변두리 효과’를 깊게 탐구할 공간이 없다.
{1} 영국 영어로 wank는 자위를 뜻한다. 다소 익살맞은 표현을 독자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 역주를 단다.